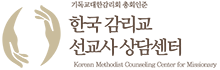요즘 자존감은 거의 신앙처럼 여겨진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자신을 믿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남들의 평가에 신경 쓰지 말고 당당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존감이 높아야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공식은 이제 모든 삶의 처방처럼 쓰이고 있다.
문제는, 그렇게 강화된 자존감이 실제 삶을 단단하게 만들기는커녕, 때때로 더 불안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겉으로는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지만 조금만 비판을 받아도 금방 위축되고, 실수했을 때는 참지 못하고 자책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럴까.
약해서가 아니다. 너무 강해지려 애쓰는 태도가 문제인 경우가 많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칭찬하고, 괜찮다고 다독이며, 남들보다 나아야만 의미 있다고 여기는 자존감은 실제로 튼튼한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애써서 지켜야만 하는 가짜 이미지, 즉 겉모습에 불과하다. 한 번 흔들리면 쉽게 무너져 내리는 이유는, 그것이 근육이 아니라 갑옷이었기 때문이다.
강화된 자존감의 또 다른 문제는 실패와 슬픔, 취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이 정도에 무너지면 안 되지.”
“다들 잘 버티는데 나는 왜 이러지?”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하니까 약한 모습은 감춰야 해.”
이런 말들은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자기암시처럼 들리지만 실은 자기 존재에 대한 조건부 수용일 뿐이다. 약한 나, 실수한 나, 주저앉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존감은 결국 자학에 가까워진다.
지인이 울음을 터뜨리며 “나 요즘 너무 힘들어”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래, 그럴 수 있어”라고 반응하는가. 혹시 그 순간 머릿속으로 먼저 떠오른 건 “힘내야지”, “마음먹기 나름이야” 같은 말이 아니었는가. 강해져야 한다는 신념이 너무 내면화되면 자신에게는 물론 타인에게도 연약함을 허락하지 못한다. 공감 대신 통제, 위로 대신 평가가 앞선다.
심리학자 크리스턴 네프(Kristin Neff)는 ‘자기자비(self-compassion)’를 마음의 회복탄력성을 키우는 핵심 개념으로 제시한다. 이는 실수나 고통, 결점을 판단하지 않고 따뜻하게 수용하는 태도다. ‘나는 특별해서 괜찮다’가 아니라 ‘나는 인간이기에 괜찮다’는 인식에 기반하며 우월감보다는 연대감, 비교보다는 수용을 강조한다. 자존감이 자주 비교와 경쟁이 언어로 표현된다면 자기자비는 연결과 이해의 언어다. 강화된 자존감은 나를 특별하게 유지하려 애쓰게 하지만 자기자비는 보통의 나를 그냥 그대로 껴안는다.
자기자비의 결여는 아이들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자존감을 길러주겠다며 “넌 최고야, 잘할 수 있어”만 반복한다. 하지만 정작 실패했을 때 아이가 좌절하거나 자책을 멈추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짜 자존감이 자라난 것이 아니다. “괜찮아, 실수해도 돼”, “그럴 수 있어, 다시 해보면 돼”라는 말이 훨씬 위안이 된다. 연약함을 수용하는 언어가 아이의 내면을 지탱해 주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자존감은 정말 건강한 것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스스로를 설득해야만 유지되는 불안한 버팀목인가. 진짜 자존감은 강한 게 아니다. 무너져도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능력, 성공하지 않아도 존재가치가 있다고 믿는 신뢰,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고요하면서도 단단한 중심, 그것이 진짜 자존감이다. 이 자존감은 외적 증명으로 높아지는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연약한 순간에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
믿음이 깊은 사람은 항상 밝고 감사한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애통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주저앉을 줄 아는 사람이다. 예수조차 겟세마네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내가 괜찮을 때만 사랑받는다고 믿기 쉽지만, 무너지고 부족할 때조차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잘난 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이다. 그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덜 강해져도 괜찮은 사람을 시작할 수 있다.
김화순∥심리상담센터 엔, 한국감리교선교사상담센터
<저작권자 © 당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