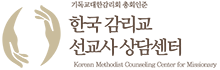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짧은 순간, 거의 반사적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든다. 급한 연락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자가 있어서도 아니다. 그 몇 초 동안의 시간이 어색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가만히 서 있는 상태, 아무 자극도 없는 순간이 점점 불편해지고 있다.
알베르 카뮈의 소설 <이방인>의 첫 장면은 어머니의 죽음을 알리는 전보로 시작되지만 독자가 멈칫하게 되는 지점은 그 이후다. 주인공 뫼르소는 장례식에 참석하지만 울지 않는다. 슬프다는 말도 하지 않는다. 대신 햇볕이 눈부셨고 날씨가 더웠으며 몸이 피곤했고 커피를 마셨다는 사실들만 나열한다. 감정에 대한 설명도 의미를 덧붙이는 해석도 없다. 그래서 불편해진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 왜 이 상황을 그냥 지나치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불편함은 뫼르소의 태도 때문이라기보다 감정은 반드시 드러나야 하고 설명 가능해야 한다는 기대에서 비롯된다. 슬픔에는 울음이 따라야 하고 애도는 타인이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자연스럽게 배워왔다. 그런데 이 장면은 규칙을 비껴간다. 감정을 부정하지도 과장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그대로 두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 시간에는 반응할 대상도, 판단할 근거도, 말을 보탤 여지도 없다. 그래서 오히려 불편해진다.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은 상태를 견디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이다.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감각은 곧 불편함이 되고, 우리는 그 불편함을 지우기 위해 무언가를 끼워 넣는다.
하나의 작은 사건에도 시시콜콜 반응해야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문제라도 생길 것처럼 무언가를 손에 쥐어서 시간을 채운다. 감정이 애매하면 곧바로 이름을 붙이고 상황이 불분명하면 빠르게 해석을 덧붙인다. 설명되지 않은 상태는 낭비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생각과 말과 화면으로 틈을 메운다. 그 결과 하루는 빽빽해지지만 회복은 멀어진다.
몸은 잠시 멈춰 있지만 마음은 계속 반응하고 있다. 이 반응이 끊임없이 반복되며 피로로 바뀐다. 쉬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은 이유는 쉬는 동안에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뫼르소의 장례식 장면은 독자를 위로하지도 이해시키지도 않는다. 설명되지 않은 상태를 그대로 두고 지나간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쉽게 잊히지 않는다. 문학은 때때로 의미를 제공하기보다 공백을 견디게 만드는 방식으로 독자를 붙잡는다.
어떤 일은 해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떤 감정은 말이 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기도 한다. 모든 경험이 곧바로 정리될 필요가 있을까. 그것만이 정답일까. 설명이 늦어질수록 경험은 오히려 자기 안에서 더 오래 머물게 될 텐데 말이다.
생각해 보면 진짜 지치는 순간은 일이 많을 때가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견디지 못할 때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 삶은, 결국 스스로를 쉬지 못하게 만든다.
하루의 시간표 속에서 ‘無’인 시간은 얼마나 될까. 모든 순간을 의미와 설명으로 채우지 않아도 된다고 느낄 수 있는 여백은 남아있는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을 불안 없이 통과할 수 있다면 우리의 하루는 지금과 얼마나 달라질까.
김화순 소장 한국감리교선교사상담센터, 심리상담센터 엔
출처 : 당당뉴스(https://www.dangdangnews.com)
<저작권자 © 당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