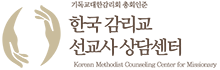아주 성실하게 신실한 마음으로 선교에 전력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다. 그분과 자주 전화로 얘기할 기회가 있는데, 선교사님은 항상 ‘할렐루야!’로 반갑게 인사를 하신다. 그 말이 싫은 것도 아니고 당연히 써야 하는 말임에도 귀의 어느 부분에서 무언가 덮이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대화의 반 이상이 ‘하나님의 뜻, 영광, 기도로, 영적 전쟁’과 같은 말들로 채워지는 분들도 계신다. 그 말들이 참으로 귀하다 생각이 들면서도 때로는 아무에게나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을 볼 때 느껴지는, 어쩐지 가벼운 울림처럼 다가올 때가 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불편할 때가 있다니, 그것도 목사가 그렇다니 참으로 한심할 노릇이다. 예배에서, 회의에서, 심지어 설교에서 등장하는 익숙한 말들이 마음에 걸리다니 말이다. ‘헌신합시다, 순종해야 합니다, 은혜로 받아야죠’와 같은 말들이 처음에는 그저 내 마음이 예민해서인 줄 알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불편함의 이유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누군가를 향한 말이 실제 삶과 연결되지 않을 때 울리는 경고음 같았다.
그 말들이 삶과 만날 지점을 찾지 못하면 마음속에 묘한 거리감이 생긴다. 교회의 언어는 여전히 거룩하다. 그러나 그 거룩함이 일상과 닿지 않고 공중에 떠 있는 듯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럴 때 오히려 내면의 질문이 더 커진다. 왜 이 말이 지금 필요한지, 왜 이 순간에 반복되는지, 속으로 곱씹으며 묻곤 한다.
교회의 언어는 원래 신앙 고백의 언어다. 그러니 당연히 아름다운 말들이 오가야 한다. 세상과 다른 가치를 지키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만들어 주는 힘이 있다. 십자가, 은혜, 구속 같은 단어들은 그리스도인에게 독특한 의미망을 갖는다. 문제는 이 말들이 사람을 살리기보다 억누를 때 생겨난다. 상처투성이인 사람에게 “믿음으로 이겨라”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고통이 될 수 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로 받아라”라고 할 때, 현실을 직면할 힘을 주기보다 현실을 덮으라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들어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부의 그물, 농부의 씨앗, 잃어버린 드라크마, 아들의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다. 바울도 아레오바고에서 철학자들의 말을 인용하여 복음을 풀어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현실의 언어로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 언어도 사람들의 삶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나는 요즘 의도적으로 말을 바꾸는 연습을 한다. “헌신합시다” 대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릴 마음을 준비합시다.”라고 말한다. “순종해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더 내디뎌 봅시다”라고 한다. 말 한마디가 바뀌었을 뿐인데 듣는 이들의 표정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어떤 이는 끝나고 찾아와서 ‘오늘 말씀은 부담이 아니라 용기로 다가왔다’고 말하기도 한다. 단어 하나가 마음의 문을 닫게도, 열게도 한다는 사실을 새삼 느낀다. 어떤 말은 사람을 무겁게 하고 어떤 말은 그 사람 안에 잠재되어 있는 힘을 깨운다.
교회의 언어는 반드시 세상과 구별되기보다 살리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사람을 살리고 삶과 연결시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게 하는 말이어야 한다. 우리가 쓰는 말이 누군가를 위축시키거나 소외시킨다면 그 말은 복음의 언어에서 멀어질 수 있다. 말이 멀어질 때, 하나님도 멀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도 사용하는 언어를 점검한다. 그리고 묻는다. 이 말이 사람에게 친밀하게 다가가고 있는가?
김화순∥심리상담센터 엔, 한국감리교선교사상담센터
출처 : 당당뉴스(https://www.dangdangnews.com)
<저작권자 © 당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