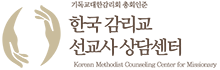어릴 적 집 한구석에는 오래된 의자가 하나 있었다. 앉을 때마다 한쪽이 삐걱거렸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 의자를 버리지 않았다. 불편했지만 없으면 허전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가끔 나는 그 의자가 오래된 인간관계와 닮아 있다고 느낀다. 이미 쓰임은 다했지만 버리자니 마음 한켠이 허전할 것 같은 그런 불편한 친밀감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기대며 산다. 살아 있는 동안 그늘이 되어 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기대가 지나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기대가 의지가 되고, 의지가 어느새 사슬처럼 얽혀버리는 경우라면 말이다. 상대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질 것 같아 손을 놓지 못하고, 그를 붙든 채로 나 역시 똑바로 서지 못한다. 그렇게 필요하다 느꼈던 관계가 어느 순간 서로의 발목을 잡아당기는 짐이 되어 버린다.
이런 관계를 동반의존(co-dependency)이라 부른다. 이 말은 20세기 중반, 알코올중독 치료 현장에서 처음 붙여진 이름이다.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를 돌보려 애쓰는 가족 역시 다른 형태의 중독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사람을 구하려다 결국 그 사람의 문제 속에 갇혀 버리는 역설, 사랑의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불안과 통제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이 개념은 1970년대 이후 가정폭력과 만성질환, 종교 공동체로까지 넓혀졌다. 겉으로는 헌신과 돌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상대가 변해야 내가 안심할 수 있다는 불안이 자리하고 있는 상태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다 자기의 삶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동반의존의 뿌리에는 불안과 통제라는 두 기둥이 서 있다. 상대가 불행하면 나도 불행해질 것 같아 두렵고,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상대를 구해야 한다는 강박이 생긴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사랑은 조건과 의무로 변한다. 상대가 변하지 않으면 자신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 불안은 더 큰 통제로 이어진다. 결국 서로의 숨을 조이는 그물에 갇히게 된다.
이런 얽힘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낯설지 않다. 직장에서 늘 분위기를 중재하는 사람, 가족 모임에서 다툼을 막기 위해 웃으며 모든 부담을 감당하는 사람, 교회 공동체에서 남의 마음을 챙기느라 자기 감정을 삼키는 사람, 그들은 언제나 ‘나라도 버티지 않으면 관계가 깨질 것 같다’는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그 불안이야말로 관계를 숨 막히게 만드는 가장 강한 작용이다.
성경은 “서로 짐을 지라”(갈6:2)고 하면서도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갈6:5)고 덧붙인다. 함께하되, 대신 지지 말라는 뜻이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유로 상대의 짐까지 대신 들려고 한다. 그러나 그 사랑은 때로 구속이 된다. 상대를 살리려다 나를 잃고 서로의 생기를 앗아가는 관계, 그것이 동반의존의 그림자다.
동반의존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관계를 끊자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사랑의 관계를 살리기 위해 건강한 거리를 두자는 것이다. 버려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들고 있어야만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불안이다. 불안을 내려놓을 때, 사랑은 다시 숨을 쉰다.
낡은 의자가 떠오른다. 앉을 때마다 한쪽이 기울고 삐걱거렸지만, 그 의자를 버린다고 집이 무너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공간이 생겼고 그 자리를 햇살이 차지했다. 관계도 그렇다. 놓아주는 것은 떠남이 아니다. 서로가 제자리에 서도록 돕는 일이다. 오래된 의자를 문밖에 내놓듯, 마음속 오래된 불안을 내려놓을 때 관계는 얽힘이 아니라 쉼이 된다.
김화순∥심리상담센터 엔, 한국감리교선교사상담센터
출처 : 당당뉴스(https://www.dangdangnews.com)
<저작권자 © 당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