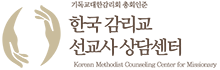감리교회의 어른 한 분이 소천하셨다. “빈소를 차리지 말고 예배만 드려 달라”는 유언에 따라 섬기시던 교회에서 단 한 번의 환송예배만 드려졌다고 한다. 화려한 꽃도, 조의금도 없는 예배였지만 오히려 더 단정하고 품위가 있었다고 한다. 마지막까지 담백한 그분의 선택이 그분의 삶을 가장 잘 말해 주는 듯했다. 함께한 이들은 “생전의 신념이 그대로 드러난 예배였습니다.”라고 표현했다.
며칠 뒤, 코미디언계의 대부로 불리던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그의 후배들은 울면서도 웃었다. “선배가 늘 우리를 챙겨주던 모습이 이 장례에 다 남아 있네요”라며 그를 기렸다. 무대 위의 웃음보다 무대 밖에서 흘려보낸 따뜻한 배려가 마지막 길에서 더 선명히 드러난 것이다.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갑자기 달라지지 않는다. 마지막은 살아온 날들의 결산이며, 그 사람의 삶이 고스란히 스며 나오는 자리다. 두 장례는 분위기도 감정의 결도 달랐지만, 각자 평생 살아왔던 삶의 결이 마지막 순간에 묻어났다는 점은 같았다.
우리는 흔히 나이를 어른 됨의 기준으로 삼지만, 사실 나이는 그저 세월을 증명할 뿐이다. 어른이라 불릴 만한 사람은 자신의 무게를 견디면서도 타인을 짓누르지 않는 이들이다. 상처를 핑계로 날카로워지지 않고, 권력을 쥐고도 겸손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그 곁에 있으면 왠지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지는 사람, 그런 얼굴들이 하나둘 떠오른다.
마지막은 잔혹할 만큼 정직하다. 평생 쌓은 업적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가 그 자리를 빛나게도, 쓸쓸하게도 만들기 때문이다. 사람이 떠난 뒤 남는 것은 재산도 명예도 아닐 것이다. 남겨지는 건 결국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 사람의 태도와 관계다.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더 숙연해진다.
두 장례식은 내게 굵직한 메시지를 던졌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지막은 어떤 표정으로 남게 될까. 젊을 때는 무엇을 이루었는지로 자신을 증명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는 것은 ‘어떻게 살아왔는가’라는 물음뿐이다. 관계도 그렇다. 세월이 흐를수록 겉치레가 벗겨지고 날것의 진실만 남게 된다. 노년의 외로움은 대개 재산이 아니라 놓쳐버린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걸, 나이를 먹을수록 실감하게 된다.
아름다운 마지막은 결코 꾸며낼 수 없다. 마음을 낮추고, 고마움을 전하고, 먼저 안부를 묻는 사소한 태도가 언젠가 우리의 마지막을 가장 단정하고 향기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 날들이 쌓여, 떠난 뒤에도 오래도록 기억 속에 은은한 온기로 남는다.
어른의 품격은 마지막에서야 비로소 드러난다. 진짜 어른은 늦게 피어난 꽃처럼 마지막이 가장 고요하고 아름답다. 그 마지막이 쓸쓸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오늘의 표정과 말투부터 조금씩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조용히 건넨 인사나 미소 하나가 마지막 장면의 빛깔을 바꿀 수도 있다.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하며 사는 게 아니다. 그저 오늘의 작은 몸짓들이 모여 그 순간을 완성해 간다고 볼 수 있다. 그날이 언제일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자리를 바꾸는 힘은 특별한 업적이 아니라 지금의 태도에 달려 있다.
어쩌다 오래전 인연이 떠오를 때가 있다. 그 사람의 얼굴은 흐릿해도 건네던 말투나 손짓은 또렷이 남아 있다. 마음이 서늘할 때 문득 떠오르는 것은 의외로 사소한 따뜻함이다. 그게 왜 그리 오래 남는지 설명할 길은 없다. 우리가 남기는 것은 결국 말보다 공기처럼 스며 있던 마음의 결일지 모른다. 그것이 부드러우면 이별도 덜 날카롭다. 그립지만 따뜻하다. 마지막은 멀리 있지 않았다. 오늘 스친 시선과 숨결 속에 이미 조금씩 그려지고 있었다.
김화순∥심리상담센터 엔, 한국감리교선교사상담센터
출처 : 당당뉴스(https://www.dangdangnews.com)
<저작권자 © 당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