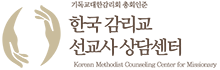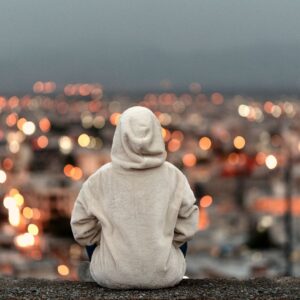
| “90이 넘은 치매 어머니를 혼자 돌보다 지쳐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요양원으로 가라고 하고 요양원에서는 병원 치료가 끝나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돌아가며 책임을 미룹니다. 결국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어머니를 데리고 떠돌 뿐입니다.” 이 중년 여성은 “하나님도, 나라도, 아무도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요”라며 슬픈 웃음을 지었다.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있는 ‘울분’이라는 감정의 집합적인 표현이다. 눈물도 분노도 절망도 이미 넘어있는 상태, 그런데도 삶은 계속되기에 그냥 꾹 눌러 담고 살아가는 감정의 퇴적, 이것이 바로 장기적 울분이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말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때의 무력감이다. 울분은 억울함과 분노가 섞인 감정이지만 단지 화가 나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도움을 청했으나 외면당했고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당했고 믿었던 시스템이 반복적으로 실망시킬 때 생겨나는 감정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계층을 바꾸기 어렵다고 응답한 20-30대 청년층이 70%를 넘겼고 불공정과 불평등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다수였다. 또 다른 언론에서는 돌봄 사각지대, 임금 격차, 정치에 대한 깊은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울분 사회”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지금 우리 사회는 누적된 감정이 울분이라는 이름으로 부유하고 있다. 이 감정은 세대에 따라 다양한 얼굴로 나타난다. 한쪽에서는 가족을 돌보며 사각지대에 내몰린 중년의 돌봄자들이 “왜 우리만 책임져야 하냐”는 말조차 꺼낼 수 없어서 혼자 울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청년들이 “도대체 뭘 더 노력해야 하죠? 노력한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아버렸어요. 다들 너무 쉽게 말해요. 괜찮아질 테니 열심히 하라고, 감사해야 한다고요. 그런 말은 나를 더 외롭고 괴롭게 만들 뿐이에요”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정당한 분노조차 과민 반응으로 치부되는 분위기,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말하는 것조차 포기하는 침묵의 시대, 이때부터 울분은 안에서 고이고 썩고 굳어져 버린다. 이러한 감정은 정치적 무력감으로도 연결된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삶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공정과 정의라는 말이 더는 설득력을 갖지 못할 때, 사람들은 투표조차 의미 없다고 여긴다. 정서적 양극화와 감정의 고립이 극단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무력한 현실 앞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적어도 지금은 괜찮아질 것이라는 섣부른 위로보다 “그래, 괜찮지 않지”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군가 울분을 토로할 때, 참으라고 훈계하기보다 얼마나 힘들었냐고 보듬어 물어줄 수 있어야 한다. 공감 없는 경건은 공허하고 경청 없는 신앙은 책임을 회피하는 언어가 될 뿐이다.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욥도 울분을 안고 하나님께 항변했고 시편 기자는 “언제까지 숨으시렵니까?”라며 절규했다. 믿음은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릴 수 있는 신뢰에서 시작된다. 교회는 울분을 죄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고 함께 걸어줄 수 있어야 한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로마서 12:15)는 말씀은 동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공감의 영성이며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사명의 회복이다. 울분은 시대적인 병이지만 그것을 함께 느끼고 다룰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위로보다 경청, 해결보다 함께 울어주는 자리, 해답보다 존재의 동행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 자리에서 비로소 말해도 달라지지 않던 현실이 함께 있어서 견딜 수 있는 삶으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김화순 소장∥심리상담센터 엔, 한국감리교선교사상담센터
|
| <저작권자 © 당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