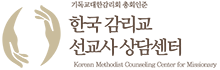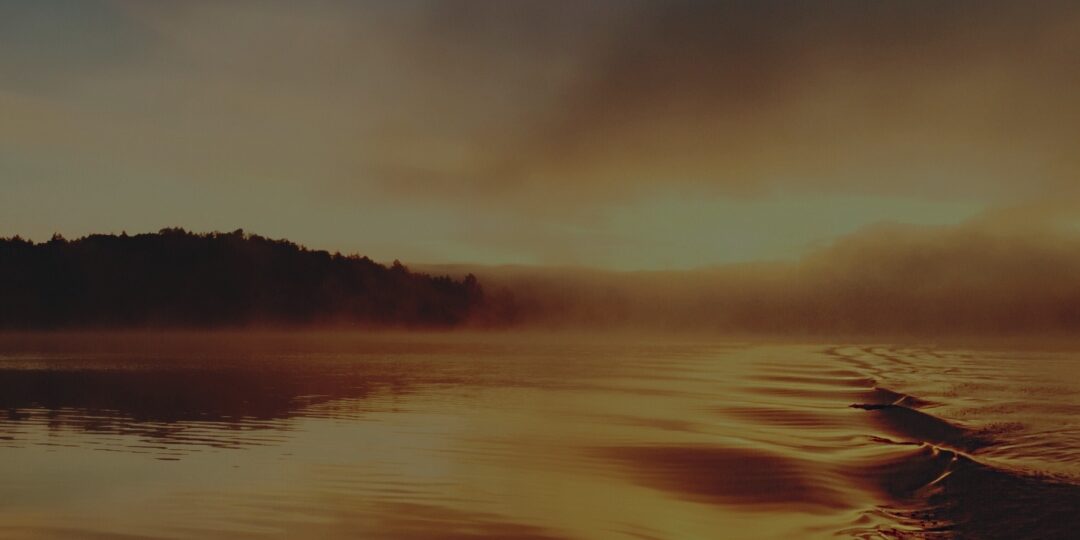저녁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저쪽에서 한 여성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달리면서 옷을 하나씩 벗어던졌고, 뒤따라오는 경찰을 연신 돌아보며 횡단보도를 가로질렀다. 버스와 자동차 안에 있던 사람들, 길을 걷던 이들이 그 장면을 바라보았지만,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는 몇몇을 제외하면 누구도 가까이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내 옆을 지나가던 사람이 일행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정신 나간 여자인가 봐.” 그 한마디가 공기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경찰은 섣불리 손을 대지 못했고, 추가 경찰 인력이 도착하고 나서야 상황이 가까스로 정리되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거리에는 한 사람의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옷을 벗어 던지며 질주하던 위험한 행동 뒤에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훨씬 더 긴 시간-말하지 못한 아픔, 오랫동안 방치된 고립과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돌발 행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체 얼마나 오래 혼자 아파왔을까?”라는 질문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었다.
거리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예배 중 갑자기 고함을 지르거나 설교자를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가거나, 다른 성도를 밀치고 뛰쳐나가는 사건은 더 이상 낯설지만은 않다. 누군가에게는 큰 정신적 충격을, 누군가에게는 실제 물리적 상해를 남기기도 한다. 예방은 어렵고 사건 이후의 수습은 더 난감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한마디를 툭 던지곤 한다. 그러나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말은 상황을 가볍게 다루는 동시에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한다. 이상 행동의 상당수는 의지 부족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절실한 정신적·신경학적 위기 상황이라는 점이다.
갑작스러운 질주, 옷을 벗는 행동, 반복되는 비명은 조현병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사고의 와해일 수 있다. 누군가에게 쫓긴다고 느끼는 피해망상, 현실 판단력의 급격한 저하는 일상을 무너뜨린다. 반대로 잠을 거의 자지 못하고 과흥분 상태가 이어지는 양극성 장애의 조증 삽화에서도 억제되지 않는 충동, 과감한 도주, 감정 조절의 붕괴가 나타난다. 심각한 불안이나 외상을 겪은 후 현실감이 희미해지는 해리성 반응 역시 비슷한 행동을 동반할 수 있으며, 알코올이나 약물도 급성 혼란의 강력한 촉매가 된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례에서 당사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다. 꾸짖는다고 멈추지 않고, 설명한다고 납득하는 것도 아니며, 기도만으로 즉각 안정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위기와 위험 속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고, 이미 오랫동안 혼자 버텨온 사람들이다.
코로나 이후 정신건강 지표는 악화되었고, 우울·불안·조현병 첫 발병률은 모두 증가했다.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약물을 갑자기 끊는 사례도 많아졌다. 무엇보다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이기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교회라면 나를 받아줄 것”이라는 희미한 기대를 품고 찾아오곤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이러한 상황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리고 누군가의 무너짐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가. <다음 편에 계속>
김화순 소장∥심리상담센터 엔, 한국감리교선교사상담센터
출처 : 당당뉴스(https://www.dangdangnews.com)
<저작권자 © 당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