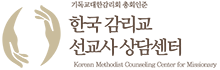『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의 저자 백세희 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수많은 사람의 손에 들려 한국 사회의 감정 풍경을 바꾼 책이었다. 제목은 인간의 내면을 가장 정직하게 드러낸 문장이었다. 삶이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떡볶이 같은 작은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 그 모순은 사실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다.
작가는 기분부전장애를 앓으며 자신의 정신과 치료 과정을 담담히 기록했다. 겉으로는 일상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하루를 버티는 일조차 벅찼다고 고백했다. 이 책이 큰 공감을 얻은 이유는 ‘힘내라’는 말이 넘쳐나는 사회 속에서 “나는 오늘도 힘들다”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고백은 약함이 아니라 진실이었다. 그러나 작가는 끝내 삶을 놓았고 장기기증을 통해 다섯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 삶을 내려놓았지만 생명을 남긴 역설, 그 마지막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고통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우리 사회는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 있다. 억제는 미덕이 되고 약함은 결함으로 여겨진다. 외로움과 슬픔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자기 안으로 침잠한다. 백세희 작가의 고백은 이런 감정의 문맹 시대에 대한 경고였다. 남의 마음을 해석할 줄 모르고 자신의 감정을 말하는 법도 잃어버렸다. 그가 “나는 아프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 자신이 보였다”고 했을 때, 그것은 우울의 언어가 아니라 존재의 각성이었다.
교회는 오랫동안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는 말로 성급하게 감정을 신앙의 틀 안에 가두어 왔다. 그러나 우울과 불안은 죄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다. 그 신호를 신앙으로 눌러버릴 때 사람은 더 깊은 고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예수는 감정의 언어를 잃지 않으셨던 분이다. 우셨고 분노하셨으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셨다. 신앙은 고통을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고통 속에 머물 수 있는 용기다. 그 용기를 잃을 때 교회는 돌봄의 기능을 잃게 된다.
이 책이 처음 서점에 진열되었을 때, 가볍지만 그 무게감에 선뜻 발길을 멈추었었다. 지독한 양가감정의 표현이라 생각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상태, 이 모순된 감정은 오히려 살고자 하는 마음의 마지막 불빛이 아닐까. 누군가 그 말의 뒷면을 읽어주었다면 그는 여전히 살아갈 이유를 찾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신호를 너무 자주 놓쳐버린다. “기도해봐라”는 말 한마디로 절실한 마음을 덮어버린다. 하지만 그 미약한 신호를 붙잡아주는 일이야말로 공동체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하나의 생명은 그렇게 다시 이어진다.
이제 교회는 예배의 자리만큼 경청의 자리를 회복해야 한다. 성경은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한다. 그것이 바로 공감의 실천이다. 눈물을 설명하기보다 함께 흘릴 때 신앙은 현실이 된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보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라는 한마디가 더 복음일 때가 있다. 작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묻는다. 괜찮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어디까지 품을 수 있는가.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의 마음은 문장으로 알알이 남아 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다.” 그 말은 절망이 아니라 희미한 희망의 증거다. 누군가 그 작은 신호를 듣고 함께 떡볶이를 먹으며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신앙이 될 수 있다. 이제 교회는 다시 배워야 한다. 사람의 마음을 듣는 법, 감정의 언어를 이해하는 법, 죽고 싶지만 여전히 살아가려는 사람을 품는 법을!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조용한 경종이다.
김화순∥심리상담센터 엔, 한국감리교선교사상담센터
출처 : 당당뉴스(https://www.dangdangnews.com)
<저작권자 © 당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