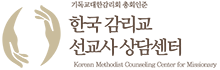| 봄이 왔건만, 꽃보다 먼저 검은 연기가 피었다.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주변 지역으로 번졌고 영덕과 울진, 청송, 안동 등 낯익은 이름의 마을들이 잿더미로 바뀌었다. 삶의 터전인 집들이 무너졌고 논과 밭, 산, 문화재들까지 불길은 가리지 않고 삼켜 버렸다. 이웃을 살리기 위해 다시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간 소방대원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고 불이 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절망뿐이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겨울과 봄 사이, 바람이 이토록 거세고 땅이 이토록 말라붙은 적이 있었느냐고 말이다. 이상 기후는 더 이상 과학자의 통계가 아니라 우리의 코 앞, 숨결에 들어와 있다. 재난은 이제 멀리 있는 위험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마당 앞에서 타오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과 불은 모두 생명을 살리는 힘이지만 그 방향이 조금만 달라지면 삶을 위협하는 재앙이 되기도 한다. 3월 말 현재까지 30명이 숨지고 이재민은 3만 7천 명을 넘어섰다. 눈에 보이는 피해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사람들의 타들어 간 심정이었다.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평생 일구어 온 밭을 잃고 사랑하는 이의 목숨까지 잃은 사람들은 몸은 살아남았지만 삶은 무너졌다고 말한다. 심리적 충격에 휩싸여 있을 이재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걱정과 염려가 밀려온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따르면, 대형 산불과 같은 재난을 겪은 후 피해자 3명 중 1명꼴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증상을 경험하며 우울, 불안, 수면장애 등을 겪는다. 심장이 계속 쿵쾅거리거나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거나, 생각이 멈춘 듯 멍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다. 특히 재난 직후 3개월 안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가장 치명적일 수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닌 고통을 같이 느껴줄 대상이다. 재난은 삶을 앗아가기도 하지만 그 와중에 남은 사람들의 마음도 깊이 할퀴고 간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 앞에서 건넬 수 있는 말은 그리 많지 않다. 말보다 더 먼저 건네야 할 것은 함께 있어 주는 마음일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과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단순한 구호를 넘어서야 한다. 이미 여러 교회와 단체들은 현장으로 달려가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임시 대피소에서 봉사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 필요한 것은, 쉽게 잊지 않고 오랫동안 함께 있어 주는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의 마음이다. 교회는 그동안 신앙과 삶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한 채, 위로의 언어만을 반복한 적이 있었다. 지금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하나님은 늘 약한 자의 편에 서셨고 예수는 불쌍한 무리를 보시며 그들과 함께 있어 주셨다. 그렇다면 지금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는 강단보다 훨씬 더 낮고 먼 곳, 타버린 마을 한복판, 울음 섞인 대피소, 무너진 마음 곁이다.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은 이미 현장에 파견되어 구호 활동과 동시에 심리상담사를 배치하여 초기 충격을 함께 견디고 있다. 또 몇몇 교회들은 장기적인 정착 지원과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 이런 일은 신앙의 언어와 심리적 전문성이 함께할 때 가능해진다. 신앙은 마음의 회복을 지지하고 전문성은 현실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기후 위기의 시대, 우리는 점점 더 자주 이런 재난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2023년 한 해에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은 576건, 피해 면적은 2,968헥타르에 달한다고 한다. 기후학자들은 한국이 이제 산불 비상 국가로 진입했다고 말한다. 재난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닌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 불은 타오르고 시간은 지나간다. 그러나 끝내 남는 건, 사람이 사람을 잊지 않았다는 기록이다.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다시 삶을 시작하고 있다. 그 곁에 누가 있었는지, 어떤 손길이 있었는지, 그 기억이 남게 될 것이다. 불은 모든 것을 앗아가지 못했다. 타오르고 사라져도 남는 것이 있다. 그것이 희망이고 다시 살아낼 이유다.
김화순 소장∥심리상담센터 엔, 한국감리교선교사상담센터 |
| <저작권자 © 당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