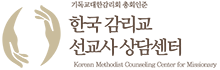| 분주히 오가는 버스,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 기다림을 나르는 택배기사, 길모퉁이에서 은근히 유혹하는 붕어빵 냄새. 익숙한 풍경들은 단순히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세상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정교한 퍼즐 조각과도 같다. 어쩌면 우리는 소소한 움직임들이 만들어내는 안정감 덕분에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도 모른다. 심리학자 샐리그만(Martin Seligman)은 일상의 안정감이 회복탄력성을 키우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보았다. 그런 점에서 익숙한 풍경의 지속성은 그 자체로 무언의 위로가 된다.
얼마 전 서점에 들렀다가 “책은 그 자체로는 조용하지만 읽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낸다”는 글귀를 보았다. 그 짧은 문장을 곱씹어 보며, 프랭클(Viktor Frankl)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는 강제수용소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간은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를 결코 잃지 않는다”고 말했다. 태도를 선택할 자유를 붙드는 일은 그가 절망을 견디며 삶의 의미를 발견한 원천이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는 일상의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말이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일이 아니라 내면을 비추고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 글 속에서 만나는 한 문장은 태도를 조정하고 마음을 다잡게 하는 나침반이 된다. 그러나 일상의 안정감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세상의 소식들은 우리를 무겁게 하고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으며 마치 끝없는 나락으로 밀어 넣는 듯하다. 정치적 갈등, 불확실한 경제, 서로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들. 이것들은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피로감을 안겨주며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사람들은 일을 하고 하루를 살아내며 새로운 날을 준비한다. 뉴스에 나온 한 노동자의 말이 떠오른다. “우리 일이 눈에 띄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이 단순한 말은 삶의 무게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여준다. 워즈니악(Amy Wrzesniewski)의 연구처럼, 일을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고 타인과 자신을 연결하는 의미 있는 장으로 인식할 때 삶의 만족도는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우리는 희망을 거대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곤 한다. 실제로는 아주 작은 순간에서 시작되고 피어나는 것이 희망이다. 피곤한 하루 끝에 문득 올려다본 하늘, 스쳐 지나가며 주고받은 짧은 미소, 편의점 알바생의 따뜻한 인사 같은 것들이 마음을 데워주고 무너질 것 같은 하루를 붙잡아준다. 소소한 긍정 경험(Micro-Moments of Positivity)은 눈에 띄지는 않지만 삶을 지탱해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된다. 작고 작은 흔적들은 삶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힘으로 돌아온다. 희망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은 순간들 속에서 조용히 자라난다. 긴 겨울은 언제나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한다. 하지만 겨울의 끝에 봄이 찾아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이치다. 다만 그 봄은 자연의 순환으로만 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서로를 향해 주고받는 미소와 격려, 무심코 건넨 친절들이 모여 서로를 지탱하며 얼어붙은 시간을 녹이고 새 계절을 만들어간다. 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계절을 만들어내고 있을까? 내딛는 걸음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우리의 걸음이 어떤 의미를 만들고 있을지는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드러날 것이다. 겨울은 여전히 깊고 길지만, 어쩌면 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미 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너무 멀리 보려 애쓰지 않아야겠다. 그저 눈앞에 놓인 한 걸음을 걷고, 주변의 따뜻한 이야기를 발견하며, 적게라도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주려고 노력할 뿐. 이 힘겨운 겨울에도, 우리는 여전히 걸어가고 있다.
김화순 소장∥심리상담센터 엔, 한국감리교선교사상담센터 |
| <저작권자 © 당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