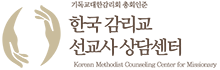| “난 원체 무용한 것들을 좋아하오. 달, 별, 꽃, 바람, 웃음, 농담 같은 것들.”
겨울로 접어드는 공원 모퉁이에서 떠오른 어느 드라마의 대사는, 쓸모없다는 이유로 지나쳐버리는 것들이 주는 잔잔한 울림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빛의 온기는 점점 옅어지고 낙엽들은 바람에 휩쓸려 흩날리며 쌓인다. 얼핏 보기에 이 낙엽들은 목적도 가치도 없어 보이지만 그 무심한 모습 속에 오히려 묵직한 평온이 스며 있다.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되묻게 한다. 현대 사회는 목표와 성취를 향한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인간의 삶을 효율성과 실용성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막스 베버는 이를 “도구적 합리성”이라 설명했는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결과만을 중시하는 태도다. 그러나 삶은 성과와 이익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용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즉 달, 별, 꽃, 바람, 낙엽 같은 사소한 존재들이 주는 경험은 실용성을 뛰어넘어 새로운 통찰을 제시한다. 빅터 프랭클은 인간의 궁극적 목표가 의미를 찾는 데 있음을 강조했는데, 무의미하게 보이는 것들이 때로 삶에 감춰진 질문을 들춰내며 내면을 풍요롭게 한다고 했다. 아무 목적 없이 흩날리는 낙엽이나 길을 비추는 희미한 달빛을 바라볼 때, 삶의 가치가 성취나 결과물과는 별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무용한 것들은 아름다운 풍경을 넘어 삶의 균형을 찾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효율성을 요구하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쓸모없는 순간을 경험할 때, 오히려 인간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면의 감정을 알아차릴 기회를 얻게 된다. 그 순간들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삶을 관조하며 삶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작은 전환점이 된다. 중시하는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과 조우할 때, 오히려 새로운 시각이 열리고 내면의 울림이 찾아온다. 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관계조차 이익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며 상대방을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여기기 쉽다. 그러나 곁에 머무르며 시간을 함께 보내고 목적 없이 나누는 대화와 웃음 속에서 관계의 본질이 드러난다. 진정한 관계란 상대방을 목적이나 수단으로 보지 않고 그 자체로 존재하는 ‘너’로서 마주하는 것이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익을 따지지 않을 때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며 그 순간들은 관계를 가볍고 유쾌하게 하면서도 깊이를 더해준다. 실용적 가치를 초월한 이 특별한 만남들이야말로 인격적이며 존재의 가치를 드러나게 해준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레 멀어지는 관계도 있다. 내게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라도 때로는 함께했던 기억을 존중하며 놓아주는 것이 관계의 성숙함일 수 있다. 이러한 ‘놓아주기’의 과정은 정신분석학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잃어버린 대상에 대한 애도를 통해 상실을 수용하고 미련을 내려놓는 것이 심리적 성숙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기보다는 그 관계의 흐름을 인정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인생과 관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된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떠나고 인연은 자연스레 흩어진다. 모든 만남과 이별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섭리가 담겨 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않는 건 그와 함께한 시간을 존중하기 위해서야’라는 누군가의 말을 되새기게 된다. 놓아주는 것이 오히려 관계의 진정성을 지키는 방법일 수 있다. 관계가 멀어지더라도 그 사람과의 경험은 삶 속에 오롯이 새겨지며 이를 통해 한층 넓어진 시선을 가진 사람으로 서게 된다. 실용적 가치를 넘어서는 무용한 것들의 세계는 단순한 낭만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재정비하고 관계를 더 진솔하게 바라보게 하며 자아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힘을 지닌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위로와 평안은 사소해 보이는 순간들에서 피어난다. 무용한 것들에 마음을 열어둘 때 삶은 실용성의 틀을 벗어나 더 넓고 온전한 모습으로 다가오며, 그 속에서 삶이 전하는 울림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김화순 소장∥심리상담센터 엔, 한국감리교선교사상담센터 |
| <저작권자 © 당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