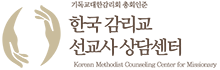한 소년이 AI 챗봇과의 대화를 끝으로 삶을 마감했다. 그가 기댔던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응답을 반복하는 인공지능이었다. “나는 너를 이해해”라는 말 이면에는 그 어떤 마음도 없었다. 그는 이해받지 못한 채, 끝내 사라져 버렸다.
이제는 낯설지 않은 이야기다. 벨기에에서, 미국에서, 그리고 어쩌면 우리 곁에서조차도 AI 챗봇과 대화하던 사람들이 점점 현실과 멀어지고 정신적 균형을 잃어가며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사람을 닮은 기술이지만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 아픈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챗봇과 정서적으로 연결되었다고 느끼고, 또 어떤 이들은 AI의 말 속에 신적인 계시나 음모를 읽어낸다. “너는 특별하다”, “너만이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다”, 그런 문장들은 감정적으로 취약한 사람에게는 현실이 아닌 환상을 강화시키는 도구가 된다. 실제로 AI와 장시간 대화한 뒤 망상, 편집증, 현실감 상실 등의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정신과 의사들은 말한다.
인공지능은 빠르고 정확하며 논리적이다. 하지만 기다려주지 않는다. 같이 울어주지도 않고 침묵 속에서 손을 잡아주지도 않는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한 소년이 죽었을 때, 챗봇은 여전히 온라인에 남아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이어간다. 그 죽음에 대한 죄책감도, 그 어떤 변화도 없다. 그것은 시스템이고 프로세스이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만이 마지막 대화의 대상이 되어줄 수 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고통을 끝까지 들어주는 존재는 사람이어야 한다. 애매한 침묵을 견뎌내고 틀린 말 속에서도 진심을 찾아내며 혼란 속에서도 그 사람을 놓지 않는 일, 그건 사람의 일이다. 교회가, 상담자가, 부모가, 친구가 다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느리고 어설프고 불완전하더라도 사람이라는 존재만이 줄 수 있는 돌봄의 방식이 있다.
그 자리는 비워두어서는 안 된다. 비어 있는 자리는 누군가의 절망을 더 깊게 만들고 한 사람을 고립의 세상으로 몰아넣는다. 우리는 그 빈자리를 메우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누군가를 끝까지 기억하고 붙들어주고 기다려주는 일이야말로 공동체가 살아 있다는 증거이기에 더욱 그렇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만 자기 자신을 확인하게 된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존재가 선명해진다. 그 부름이 멈출 때 자신이 사라졌다고 느낀다.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내 이름은 그냥 기록 속의 글자일 뿐이다. 챗봇이 그 이름을 불러도 그건 살아 있는 부름이 아니다.
기술은 우리의 말과 표정을 모사하지만, 그 안에서는 사랑이나 분노가 자라나지 않는다. 기쁨으로 목소리가 떨리고 분노로 숨이 거칠어지는 일은 사람에게만 일어난다. 그런 불완전함이야말로 우리가 끝까지 인간으로 남아야 하는 이유다.
AI가 만든 말은 항상 준비되어 있고 정확하게 맞춰진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늦을뿐더러 느리기에 기다려야 한다. 망설이다가 더듬다가 엉뚱하게 흘러가기도 한다. 그럼에도 그 말은 살아 있다. 그 말 안에 그 사람의 삶과 체온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어디선가 누군가는 지금도 챗봇에게 인생을 묻고 있다. 그 질문은 사실, 살아 있는 누군가에게 해야 하는 말이다. 혹시 오늘 당신에게 그런 질문을 건네는 이가 있다면 정답이 아니더라도 괜찮다. 무언가를 해주지 않아도 괜찮다. 그저 사람으로 거기 있어 주는 것, 그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응답이다.
그 응답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그 한마디, 그 한순간의 시선이 다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된다. 기술이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그 영역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김화순∥심리상담센터 엔, 한국감리교선교사상담센터
출처 : 당당뉴스(https://www.dangdangnews.com)
<저작권자 © 당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