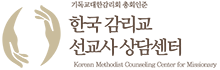일상에서 종종 망설이게 되는 사소한 순간이 있다. 말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을 때이다. 그 망설임은 대개 배려라는 이름으로 시작된다. 괜히 무례해 보일까 봐,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될까 봐,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한다.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것은 상대를 보호하기보다는 내가 불편해지지 않기 위한 결정인 경우가 많다. 말해주는 용기 대신, 침묵의 편안함을 택하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이 지나 남는 감정은 불편함이 아니라 서운함이다. 순간의 불편함보다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라는 생각이다. 누군가 조용히 알려주었다면 오히려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됐을 것이다. 관계를 상하게 하는 것은 알려주는 것 자체가 아니라 알려주는 방식과 태도다.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눈 뒤 헤어지고 나서 거울을 보았을 때, 이에 고춧가루가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이 있다. 오늘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그렇게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나눴고, 꽤 진지한 표정도 지었는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이쯤 되면 웃어야 할지, 서운해해야 할지 잠시 고민하게 된다.
만약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뭐가 묻었어요”라고 살며시 말해주었다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나를 떠올렸을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말한 쪽은 금세 잊고 들은 쪽만 두어 번 더 떠올린다. 민망함은 대체로 당사자의 몫이고 배려는 대개 말해준 사람의 몫이다.
성경을 찬찬히 읽다 보면, 말의 양보다 말의 타이밍과 방식을 더 중요하게 다룬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경우에 맞는 말이란, 아무 말이나 충동적으로 던지는 말이 아니라 상대의 얼굴과 자리를 살피는 지혜로운 행위에 가깝다. 말은 많아서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꼭 필요한 순간에 조심스럽게 건네질 때 오히려 관계를 살아있게 만든다.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말은 거창한 교훈이 아니라 상대를 난처하게 만들지 않는 정확한 한마디이다(잠언 25장).
이에 낀 고춧가루를 보고도 말하지 않는 선택을 반드시 미덕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그것은 관계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리두기였을 수 있다. 더 어려운 문제는 눈에 보이는 실수보다 태도와 말투, 반복되는 행동처럼 쉽게 짚어 말하기 어려운 순간들이다. 상처를 주는 말버릇, 회의 자리에서의 미묘한 배제,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한 무례함 앞에서 우리는 더욱 쉽게 침묵을 선택하고 만다. 성경은 그런 침묵까지 지혜롭다고 칭찬하지는 않는다. 보았고, 느꼈고, 알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는 선택은 배려라기보다 회피에 가까울 수 있다.
예수의 말하기 방식도 이 지점에서 분명해진다. 그는 불편한 말을 피하지 않았지만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방식으로 말하지도 않았다. 공개적인 수치 대신 책임을 택했고 외면 대신 존엄을 지키는 말을 선택했다. 그에게 배려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태도가 아니라 상대를 혼자 두지 않는 용기였다.
사소한 일상의 장면들은 결국 관계의 민낯을 드러낸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얼마나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조심스러움이라는 이름으로 해야 할 말을, 꼭 해주어야 하는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말해주는 일은 잠깐의 불편을 감수하는 선택이지만, 말하지 않는 관계는 서서히 서로를 놓아버리는 일이 된다. 배려는 완벽한 말솜씨가 아니라 상대를 혼자 두지 않겠다는 따뜻하면서도 지혜로운 결정이다.
김화순 소장 한국감리교선교사상담센터, 심리상담센터 엔
출처 : 당당뉴스(https://www.dangdangnews.com)
<저작권자 © 당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