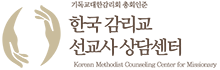자기 모순을 마주하는 순간만큼 사람을 당황하게 하는 경험도 드물다. 말로는 그렇게 믿는다고 해놓고 정작 상황이 닥치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다. 생각과 말, 신념과 행동이 어긋나는 순간들이다. 우리는 대개 그 불일치를 적당히 봉합한 채 살아간다. 그러나 자녀나 가족 앞에서는 봉합이 쉽게 풀려버린다.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가장 숨기고 싶던 모습이 드러난다.
나는 왜 이렇게 말과 삶이 다른 사람일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위기의 순간에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반응하는 것을 보며 이중성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된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일까 아니면 신앙인의 위선일까. 고백과 살아가는 모습의 간극 속에서 자신을 심하게 몰아붙이기까지 한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단일하고 일관된 자아로 보지 않는다. 하나의 얼굴로만 살아가지 않고 관계와 상황, 과거의 경험에 따라 서로 다른 자아의 측면들이 동시에 작동한다. 성숙한 신앙 언어로 반응하는 나도 있고 오래된 상처에 즉각 반응하는 나도 있으며, 설명할 힘조차 없는 피로 속에서 버텨온 나도 있다. 이 자아들은 한 사람 안에 모두 존재하지만 언제나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
신앙인은 이 불일치를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 신앙이란 본래 일관성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믿음과 삶의 일치, 고백과 행동의 정합성은 신앙의 핵심 가치다. 그래서 내 안의 어긋남은 혼란을 넘어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경험되기 쉽다. 그러나 심리적 관점에서 보자면, 어긋남이 타락의 증거라기보다 아직 통합되지 못한 자아의 흔적에 가깝다.
문제는 이 분열을 어떻게 다루느냐이다. 많은 이가 자신을 다그치는 쪽을 택한다. 더 믿어야 한다고, 더 기도해야 한다고, 더 성숙해져야 한다고 말이다.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해서 자아가 하나로 묶이진 않는다. 오히려 자아 중 일부는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린다. 말해질 수 없는 감정, 환영받지 못한 질문들은 침묵 속에서 버텨낸다.
괜찮은 신앙인의 얼굴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불안과 분노, 실망과 같은 것들을 신앙 언어로 덮어두곤 한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뒤에 분노를 숨기고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말로 상실의 슬픔을 서둘러 정리한다. 이때의 언어는 고백이라기보다 보호막에 가깝다. 더이상 다치지 않기 위한, 매우 인간적인 방어다.
이중성은 그래서 위선과 동일하지 않다. 위선은 알고도 속이는 태도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이중성은 아직 서로 연결되지 못한 자아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에 가깝다. 믿지 못하는 자아가 문제라기보다 그 자아가 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묻지 않았던 것이 문제일지도 모른다.
치유는 한쪽의 자아를 제거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 연약한 자아를 몰아내거나 의심하는 자아를 부정한다고 해서 통합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각기 다른 자아들이 어떤 역사 속에서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할 때, 비로소 연결이 시작된다. 자아의 통합이란 완벽해지는 일이 아니라 흩어진 나를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가는 과정이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과연 가장 성숙한 모습이어야 할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분열된 나를 데리고 가장 솔직한 상태로 서는 것이 아닐까. 믿는 나와 믿지 못하는 나를 함께 데려가 그 앞에 서는 용기, 그 자리에서야 비로소 숨을 제대로 쉬게 될 것이다.
질문을 바꿔보고 싶다. 나는 왜 이렇게 이중적인가라는 물음을 자책이 아닌 탐색으로, 정죄가 아닌 이해로 말이다. 이것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몰아붙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 더 진실한 사람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필요하다. 분열을 인정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그 인정이야말로, 신앙과 삶이 다시 깊어질 수 있는 출발점일지도 모른다.
김화순 소장 한국감리교선교사상담센터, 심리상담센터 엔
출처 : 당당뉴스(https://www.dangdangnews.com)
<저작권자 © 당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