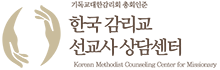상담실에서 사람을 마주하다 보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어딘가 어긋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데 그 사람이 자기 삶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다. 누가 보아도 반듯한 인상의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가 그랬다.
말끔했다. 옷차림도 말의 속도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질문을 던지면 잠시 생각한 뒤 정리된 문장으로 대답했다. 감정은 있었지만 넘치지 않았고 삶은 대체로 잘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마주 앉아 있는 동안 이상한 느낌이 계속 남아 있었다. 자기 삶 안에 편히 앉아 있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었다. 그가 말했다.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계속 피곤이 가시질 않아요.”
그 말이 나온 뒤에야 어긋남의 느낌이 무엇이었는지 조금 알 것 같았다. 그는 늘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살아왔고, 괜찮은 상태를 유지하는 법을 오래 연습해 왔다고 했다. 감정이 올라오면 스스로 다독여 정리했고, 흐트러진 모습은 되도록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고 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삶에 편히 앉아 있을 자리가 없어진 것 같다고 했다.
요즘은 휴대전화를 열기만 해도 비슷한 장면들을 마주하게 된다. 반듯한 집, 가지런한 식탁, 가장 좋은 각도의 얼굴, 완벽하다 싶을 정도의 몸매들이 들어 있다. 그곳에는 망설이거나 멈춰 서 있는 순간이 잘 보이지 않는다. 거짓이라기보다 너무 매끈하게 정리된 장면들이다. 그래서인지 오래 보고 있으면 피로감이 몰려온다.
우리는 누구나 어느 정도 자신을 다듬으며 살아간다. 문제는 그 다듬음이 멈추지 않을 때 생긴다. 하루가 살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관리하는 시간이 되면, 삶은 점점 손에 잡히지 않는다. 겉으로는 단정한데 안쪽은 텅 빈 듯한 느낌이 그때 찾아온다.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말을 종종 듣는다.
“잘 지내 보인다는 말을 들으면 더 숨이 막혀요.”
단정함은 칭찬이 되기도 하지만 오래 지속되면 또 하나의 강력한 요구가 되기도 한다. 늘 괜찮아 보여야 하고 감정은 지나치지 않아야 하며, 삶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유지되어야 한다는 요구이다. 그런 상태가 이어지면 점점 숨을 고르기 어려워진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환경이 아니라 긴장을 내려놓을 수 있는 환경이다. 정리되지 않은 말이 나와도 괜찮고 표정이 흐트러져도 어색하지 않은 자리이다. 흔히 말하는 ‘사람 냄새’라는 것도 아마 그런 감각일 것이다.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도 굳이 밀어내지 않아도 괜찮은 느낌이다.
삶의 시간을 어느 정도 지나온 사람들에게서 미적 기준이 달라지는 것도 비슷한 이유일지 모른다. 반듯한 것보다 덜 피곤한 것이 좋아지고, 화려한 것보다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곳을 선호한다. 예쁜 장면은 잠시 눈을 사로잡지만 생활감이 묻어 있는 장면은 오래 편안히 앉을 수 있게 한다.
꾸미지 않는 삶은 게으름과는 조금 다르다. 그것은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으려는 삶의 방식일 수 있다. 번아웃을 겪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것이 장식과 설명이라는 말도 그래서 낯설지 않다. 더 이상 스스로를 설득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를 몸이 먼저 알아보기 때문이다.
완벽한 사진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러나 정리되지 않은 식탁이나 말없이 앉아 있어도 되는 사람 옆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오래 머물게 된다. 삶은 원래 그런 쪽에 더 가까운지도 모른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단정한 말과 정리된 감정만을 내놓으려 할 때, 믿음은 어느새 또 하나의 역할이 되고 만다. 시편의 기도들을 떠올려 보면, 그 자리에는 정돈되지 않은 말과 감정이 그대로 놓여 있다.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은 어수선함이 아니라 어수선해질 수 없음인지도 모른다.
김화순 소장 한국감리교선교사상담센터, 심리상담센터 엔
출처 : 당당뉴스(https://www.dangdangnews.com)
<저작권자 © 당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