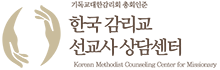죽음까지의 험난한 여정
| 최근 평일 저녁 뉴스에서 조력사망에 대한 찬반논쟁이 다뤄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 사회 역시 이 주제의 공식적인 논의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상담실에 찾아온 내담자 중에도 안락사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BBC가 선정한 21세기 위대한 영화 100선에 올랐던 <아무르>는 사람과 사랑, 그리고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영화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던 음악가 출신의 노부부 조르주와 안느의 삶을 다루고 있다. 어느 날 아내 안느가 갑자기 마비 증세를 일으키면서 그들의 삶은 하루아침에 달라진다. 남편 조르주는 반신불수가 된 아내를 헌신적으로 돌보지만, 하루가 다르게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면서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삶이라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이 선택이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믿은 남편의 사랑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랑하는 아내를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만 했던 남편의 심정은 진정한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고통이었을까. 영화는 이 힘겨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환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모습과 가족들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와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의 존엄성을 지켜주려는 모습 또한 섬세하게 그리고 있다. 남편 조르주의 마지막 선택이 가슴 아프고 씁쓸하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나의 미래가 될 수도 있기에 애잔한 마음을 넘어 두려움까지 느껴졌다. 의학의 발전은 불가능했던 질병을 치료하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지만, 한편으로 죽음의 과정을 장시간 연장시켰다는 점에서 비극일 수도 있다. 중환자들이 인공호흡기, 투석, 영양공급 튜브 등의 의료기기에 의존한 채로 생의 마지막을 맞고 있는데, 과연 이 환자들이 자연적인 죽음을 연기시킬 뿐인 이 상태를 원하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이러한 현실에서 치료가 불가능해 죽음이 예견되는 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는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또는 조력사망이라 불리는 제도를 허용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지난 세기부터 첨예한 법적, 윤리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작년 6월 발의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에는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안락사의 한 형태인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개정안을 둘러싸고 한국 사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이다. 합법화를 통해 환자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고 보다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현재 한국에서 의사조력자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도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스템의 미비, 높은 자살률 등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힘든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의료제도 안에서의 자살을 합법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죽음이 있을까? 수많은 다양한 죽음 중에 어떤 것이 내게 찾아올지 모르는데, 내가 내 죽음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이 오히려 큰 착각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삶의 마지막으로 가는 여정은 힘겹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알고자 하지 않는 죽음, 그곳에 이르는 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아닐 것이라 예측되기에 그래서 오늘이 더 뜻깊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노년의 희망은 죽음뿐이라는 사실이 차갑게 스쳐가지만 그럴수록 매일 한 번이라도 더 웃고 더 많은 온기를 남기려 노력하자는 의지를 다지게 된다. 지금 죽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주어진 일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해내었느냐 물으실 그 순간이 가장 두렵다는 어느 선교사님의 고백이 귓전을 맴돈다. 김화순∥심리상담센터 엔, 한국감리교선교사상담센터 소장 |
| <저작권자 © 당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820